[썰 만화 ] 한 여름밤의 꿈 - 마지막
[썰 만화 ] 한 여름밤의 꿈 - 마지막
난 작두를 타는 박수무당처럼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어.
그때 쯤 다시 샤워물줄기 소리가 들리더라.
난 후다닥 뛰어서 가방을 챙기고
물줄기 소리를 틈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미친놈처럼 달리는데,
한 여름에다가 여전히 대낮인데도
바람이 정말 시원~~~하더라.
온몸이 땀에 젖은 상태여서 그랬는지,
눈물이 날정도로 상쾌하더라.
그 상쾌함이 달아날까,
그늘이 있는 근처 벤치에 앉았어.
내가 본 것, 들은 것들을 곱씹으며.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거야.
바로 문이었지.
내가 들어갈 땐 분명 잠겨있었는 데,
나올 땐 정신이 없어
잠그지도 않고 그냥 나온 거야.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소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울리더라.
다시 가서 잠그는 건 정말 미친 짓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줌마가 분명 의심할텐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
“난 잘못한 것 없잖아”
맞아.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엿봤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엿봤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아줌마가 나한테 따질 일도 아니었지.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어.
문이 열려있더라.
잘못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긴장되더라.
“아이고. 조카님 왔네요이. 학원 잘 갔다 왔어?”
뭔가 어색했어.
내가 아줌마를 대하는 것도 정말 미칠 정도로 민망했고
아줌마도 날 보는 표정이 예전 같지 않게 살짝 굳어져 있더라고.
거기다가, 전에 없던 은근한 반말까지.
분명 뭔가가 있다고 느꼈어.
난 샤워를 하고 티브를 켜고 멍하니 앉아서
‘아줌마가 문이 열려있는 걸 나와 연관지었을까?’ 하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아줌마가 밥을 차려주더라.
“배 많이 고프제, 카레 했는데 맛있을랑가 모르것네잉”
문신남에게 짐승처럼 당하며 서울아가씨말투로 신음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에 난 어안이 벙벙해서 카레를 먹기 시작했어.
내가 밥을 먹는 동안,
아줌마는 또 한 쪽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앉아 날 빤히 쳐다봤어.
밥 먹으면서 흘끔흘끔 아줌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줌마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마로 흘러내리는 머리, 말간 피부, 작지만 오똑한 코,
많이 웃어야만 생긴다는 눈가의 애교주름,
더위 탓인지 발갛게 상기된 뺨.
시선을 내려 가슴도 봤어.
깊게 파인 브이넥을 입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스키점프곡선의 뽀얀 젖가슴이 자꾸 오버랩 되면서
밥 먹으면서 다시 천천히 발기.
“오늘 학원 몇 시에 끝났어?”
난 카레를 뿜을 뻔 했어. 갑자기 심장이 쿵덕쿵덕 뛰더라.
“네?
...아까 전에...”
이 아줌마.
살며시 눈웃음 지으며 날 계속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내 온몸을 오그라들게 만들더라.
난 결국 너무 긴장했는지,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
‘내 얼굴이 미쳤나!’
내 얼굴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걸 또 아줌마가 보고 있다는 걸 깨닫자,
이번에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걷잡을 수 없이 빨개지더니 나중엔
말 그대로 ‘홍당무’가 돼버렸어.
난 밥 먹다 말고 다 포기한 심정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있었어.
아줌마는 웃는 건지 뭔지 모를 표정으로
날 계속해서 빤히 보더니,
결국 깔깔거리며 웃더라.
난 속으로
‘아..눈치 챘구나, 아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가 좀 알려줘’
이러면서 아줌마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줌마는 한참을 그러고 배를 잡고 웃었어.
난 밥 먹다 말고 홍당무가 돼서 고개 숙이고 있고.
정말 누가 좀 이 상황에서 날 구해줬으면, 싶더라.
아줌마가 웃음을 겨우 그치고
갑자기 내 볼을 꼬집으면서 말했어.
“하따, 뭘 그렇게 수줍어 할 일이라고. 얼굴은 버~얼게 져가꼬잉~
,,,,
조카님. 조카님?”
“네?” 난 화들짝 놀라면서 아줌마를 봤어.
하, 아줌만데 정말 예쁘더라. 계속 같이 살고 싶더라(그 순간 진심이었다)
“여수 있는 동안 재밌게 놀다가소. 난중 되면 맘대로 놀지도 못 헌께”
하 씨발, 머리아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엿봤다는 걸 아는거야 모르는거야.
난 식탁에서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
여수의 밤거리를 도사견처럼 질주했어.
아줌마의 푸들같이 하얀 알몸을 그리며
문신남 허벅지의 징그러운 칼자국을 떠올리며
내 몸속에서 헤엄치는 올챙이 같은 호르몬들을 상상하며
독수공방에 힘들어 하는 이모의 그늘진 얼굴을 생각하며
이제 겨우 반을 끝낸 두껍디 두꺼운 정석 책을 기억하며
케냐 지평선에서 일출을 보고 있을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난 달리고 또 달렸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수많은 관념들을 쫓아내기 위해.
뭐, 숨만 차고 다리만 아프더라.
결국 터벅터벅 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
아줌마의 은근한 미소가 반겨주더라.
그 뒤로 여수를 떠나기 까지 한 달여 동안,
난 아줌마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고
그러면서도,
밤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자위를 했어.
아줌마는 끝내 알 수 없는, 힌트조차 없는 묘한 태도로 날 대했어.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빤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이모가 집에 늦게 들어와 집에 둘 만 있게 되면
“오메 더운거, 시원하게 샤워좀 해야긋~다” 라며
갑자기 뒤돌아 날 한 번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내 곁으로와 은근슬쩍 젖가슴 부근을 스치기도 하는 둥.
자신과 문신남의 섹스를 내가 봤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지,
아니면
학원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줄 알고 그냥 장난친 건 지,
것도 아니라면
그저 내가 자기를 짝사랑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로 알았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야.
이제는 10년도 훌쩍 넘은 기억이라 그저 아련할 뿐이지만,
그 아련함 때문인지
그때 한 여름 여수에서 그 아줌마와 보낸 두 달을 생각하면
꼭 꿈속을 헤매다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사춘기 소년의 폭발적인 호르몬,
중년을 향해가는 한 여자의 꿈틀거리는 정욕,
그 둘 사이에서,
엄한 규율로 자신의 피붙이를 챙기려는 이모의 사랑,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
이 모든 것들이
전라남도 여수의
한 여름 밤속에 버무려져
내겐 마치
‘꿈’ 처럼
아름답게 간직되고 있는 거야.
-끗-
이 기사는 Sseoltv.com에서 집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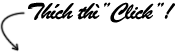
난 작두를 타는 박수무당처럼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어.
그때 쯤 다시 샤워물줄기 소리가 들리더라.
난 후다닥 뛰어서 가방을 챙기고
물줄기 소리를 틈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미친놈처럼 달리는데,
한 여름에다가 여전히 대낮인데도
바람이 정말 시원~~~하더라.
온몸이 땀에 젖은 상태여서 그랬는지,
눈물이 날정도로 상쾌하더라.
그 상쾌함이 달아날까,
그늘이 있는 근처 벤치에 앉았어.
내가 본 것, 들은 것들을 곱씹으며.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거야.
바로 문이었지.
내가 들어갈 땐 분명 잠겨있었는 데,
나올 땐 정신이 없어
잠그지도 않고 그냥 나온 거야.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소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울리더라.
다시 가서 잠그는 건 정말 미친 짓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줌마가 분명 의심할텐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
“난 잘못한 것 없잖아”
맞아.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엿봤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엿봤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아줌마가 나한테 따질 일도 아니었지.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어.
문이 열려있더라.
잘못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긴장되더라.
“아이고. 조카님 왔네요이. 학원 잘 갔다 왔어?”
뭔가 어색했어.
내가 아줌마를 대하는 것도 정말 미칠 정도로 민망했고
아줌마도 날 보는 표정이 예전 같지 않게 살짝 굳어져 있더라고.
거기다가, 전에 없던 은근한 반말까지.
분명 뭔가가 있다고 느꼈어.
난 샤워를 하고 티브를 켜고 멍하니 앉아서
‘아줌마가 문이 열려있는 걸 나와 연관지었을까?’ 하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아줌마가 밥을 차려주더라.
“배 많이 고프제, 카레 했는데 맛있을랑가 모르것네잉”
문신남에게 짐승처럼 당하며 서울아가씨말투로 신음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에 난 어안이 벙벙해서 카레를 먹기 시작했어.
내가 밥을 먹는 동안,
아줌마는 또 한 쪽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앉아 날 빤히 쳐다봤어.
밥 먹으면서 흘끔흘끔 아줌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줌마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마로 흘러내리는 머리, 말간 피부, 작지만 오똑한 코,
많이 웃어야만 생긴다는 눈가의 애교주름,
더위 탓인지 발갛게 상기된 뺨.
시선을 내려 가슴도 봤어.
깊게 파인 브이넥을 입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스키점프곡선의 뽀얀 젖가슴이 자꾸 오버랩 되면서
밥 먹으면서 다시 천천히 발기.
“오늘 학원 몇 시에 끝났어?”
난 카레를 뿜을 뻔 했어. 갑자기 심장이 쿵덕쿵덕 뛰더라.
“네?
...아까 전에...”
이 아줌마.
살며시 눈웃음 지으며 날 계속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내 온몸을 오그라들게 만들더라.
난 결국 너무 긴장했는지,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
‘내 얼굴이 미쳤나!’
내 얼굴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걸 또 아줌마가 보고 있다는 걸 깨닫자,
이번에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걷잡을 수 없이 빨개지더니 나중엔
말 그대로 ‘홍당무’가 돼버렸어.
난 밥 먹다 말고 다 포기한 심정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있었어.
아줌마는 웃는 건지 뭔지 모를 표정으로
날 계속해서 빤히 보더니,
결국 깔깔거리며 웃더라.
난 속으로
‘아..눈치 챘구나, 아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가 좀 알려줘’
이러면서 아줌마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줌마는 한참을 그러고 배를 잡고 웃었어.
난 밥 먹다 말고 홍당무가 돼서 고개 숙이고 있고.
정말 누가 좀 이 상황에서 날 구해줬으면, 싶더라.
아줌마가 웃음을 겨우 그치고
갑자기 내 볼을 꼬집으면서 말했어.
“하따, 뭘 그렇게 수줍어 할 일이라고. 얼굴은 버~얼게 져가꼬잉~
,,,,
조카님. 조카님?”
“네?” 난 화들짝 놀라면서 아줌마를 봤어.
하, 아줌만데 정말 예쁘더라. 계속 같이 살고 싶더라(그 순간 진심이었다)
“여수 있는 동안 재밌게 놀다가소. 난중 되면 맘대로 놀지도 못 헌께”
하 씨발, 머리아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엿봤다는 걸 아는거야 모르는거야.
난 식탁에서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
여수의 밤거리를 도사견처럼 질주했어.
아줌마의 푸들같이 하얀 알몸을 그리며
문신남 허벅지의 징그러운 칼자국을 떠올리며
내 몸속에서 헤엄치는 올챙이 같은 호르몬들을 상상하며
독수공방에 힘들어 하는 이모의 그늘진 얼굴을 생각하며
이제 겨우 반을 끝낸 두껍디 두꺼운 정석 책을 기억하며
케냐 지평선에서 일출을 보고 있을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난 달리고 또 달렸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수많은 관념들을 쫓아내기 위해.
뭐, 숨만 차고 다리만 아프더라.
결국 터벅터벅 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
아줌마의 은근한 미소가 반겨주더라.
그 뒤로 여수를 떠나기 까지 한 달여 동안,
난 아줌마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고
그러면서도,
밤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자위를 했어.
아줌마는 끝내 알 수 없는, 힌트조차 없는 묘한 태도로 날 대했어.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빤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이모가 집에 늦게 들어와 집에 둘 만 있게 되면
“오메 더운거, 시원하게 샤워좀 해야긋~다” 라며
갑자기 뒤돌아 날 한 번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내 곁으로와 은근슬쩍 젖가슴 부근을 스치기도 하는 둥.
자신과 문신남의 섹스를 내가 봤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지,
아니면
학원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줄 알고 그냥 장난친 건 지,
것도 아니라면
그저 내가 자기를 짝사랑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로 알았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야.
이제는 10년도 훌쩍 넘은 기억이라 그저 아련할 뿐이지만,
그 아련함 때문인지
그때 한 여름 여수에서 그 아줌마와 보낸 두 달을 생각하면
꼭 꿈속을 헤매다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사춘기 소년의 폭발적인 호르몬,
중년을 향해가는 한 여자의 꿈틀거리는 정욕,
그 둘 사이에서,
엄한 규율로 자신의 피붙이를 챙기려는 이모의 사랑,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
이 모든 것들이
전라남도 여수의
한 여름 밤속에 버무려져
내겐 마치
‘꿈’ 처럼
아름답게 간직되고 있는 거야.
-끗-
이 기사는 Sseoltv.com에서 집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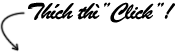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